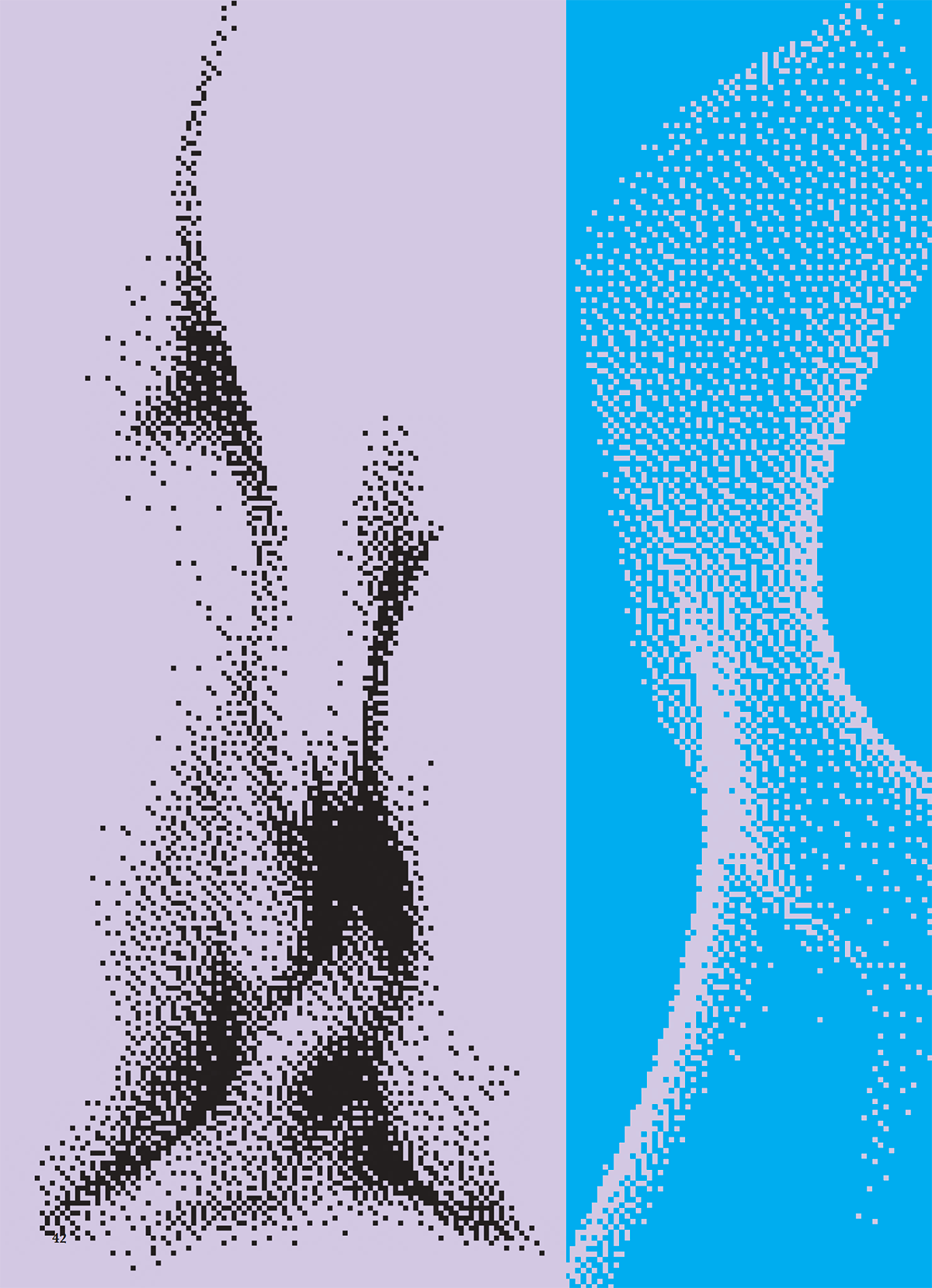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교양학부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의 특강을 기획해 학교 구성원과 그 밖의 희망자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2020년 추계 특강 ‹문화예술철학의 산실, 프랑크푸르트학파를 톺다›의 경우 사전등록을 거친 온라인 실시간강의로 3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도 비판철학의 본토에 다가가고자 하는 이들의 학구열은 막을 수 없었던 모양이다. 사회 비판을 통해 대중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온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기조 또한 그와 같이 차고도 열띤 의지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저녁 6시, 초대받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든다. 이곳은 푸른 불꽃을 닮은 비판지성의 산실, 프랑크푸르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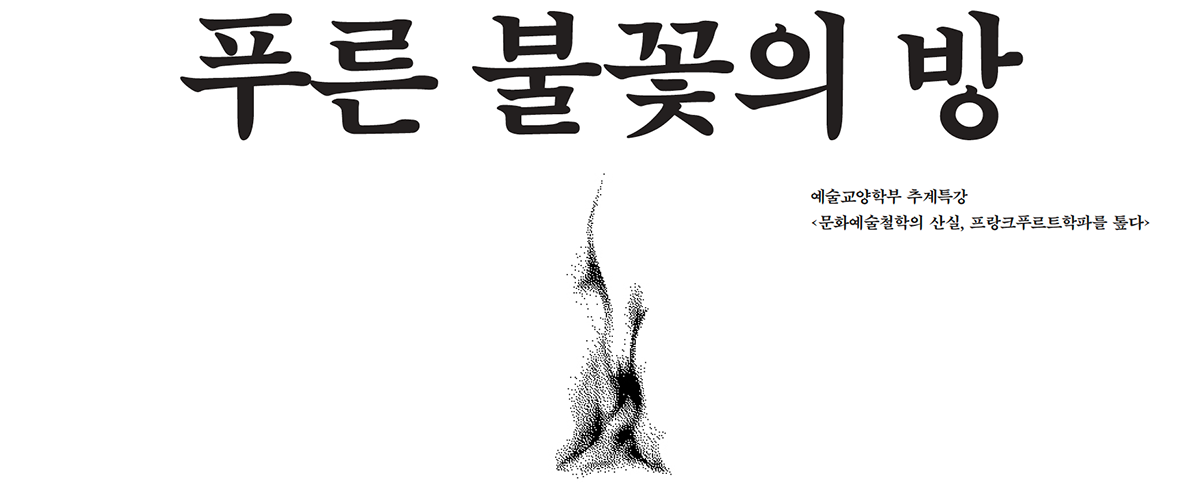
Session I
프랑크푸르트학파와 오늘
문성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프랑크푸르트학파 3세대이자 인정이론의 창시자인 악셀 호네트에게 수학한 문성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60년 역사를 개괄한다. 1930년대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막스 호르크하이머는 철학 중심의 학제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모델을 창시했고, 독일 각지에서 활동하던 정치경제학, 사회심리학, 문화이론 분야의 지성인들을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로 불러 모았다. 벤야민, 아도르노, 폴록과 뢰벤탈, 마르쿠제, 프롬 등이 그들이다. 그때부터 시작된 프랑크푸르트학파는 현존사회를 비판하고 대안사회를 모색하는 것을 기본적인 연구 이념으로 삼되, 2세대 하버마스와 3세대 호네트에 이르며 사회비판모델을 갱신해나간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철학은 당대 대중이 맞닥뜨린 사회 암적인 요소의 원인을 논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한편,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 앞선 세대의 논리를 비판적인 쇄신을 통해 이어나간다는 점에서 가히 현재진행형의 유산이라 할 만하다. 이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내부에서 발현되는 창작욕에 침잠하는 대신 그를 이끌어낸 외적인 조건들을 해석할 수 있게끔 인도한다.
Session II
아도르노, 예술가의 자기정체성
권대중 계명대학교 교수
‘칸트와 헤겔 사이의 아도르노’라는 주제로 권대중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의 강의가 이어진다. 아도르노는 명실공이 난해한 글쓰기의 대명사다. 아도르노의 글이 어려운 이유는 체계에 따라 분명하게 논증을 하거나 이해를 돕는 예시를 내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아도르노는 사유의 충돌, 즉 정(正)과 반(反)의 측면을 강조할 뿐 합(合)의로서의 결과는 유보한다. 이는 무언가를 지각한다는 것 자체가 대상을 동일한 개념으로 묶어 이해하는 일종의 인식적 폭력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아도르노는 자신의 연구대상인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을 기존의 모더니티가 추구하는 양화(量化), 개념화, 이론화, 동일화의 방법론과는 완전히 다른 글쓰기 방식으로 전개시켜 나간다. 개념을 통해서 대상을 장악하지도, 대상으로 장악당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아도르노의 반사회적 사회성은 예술의 영역이 담지하는 자유, 불확정성, 다원론적 개방성과 닮아있다. 체계를 비판하는 이론일수록 자체적인 체계의 엄밀성을 갖추되 기존 체계가 제공하는 편리성에서는 벗어나야한다. 아도르노의 사례는 예술창작자들과 비평가들로 하여금 자기정체성과 방법론을 확립하고 일치시킬 필요성을 강조한다.
Session III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다시 읽기
하선규 홍익대학교 교수
이미 기술된 역사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면 역사‘철학’이 등장할 리도 없다는 말로 강의의 포문이 열린다. 하선규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교수가 예술학교의 필독서라 할 수 있는 발터 벤야민의 역사철학적 예술철학 에세이,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장(章)별로 낱낱이 분석한다. 하 교수는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매체이론의 관점에서만 수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벤야민의 관심사는 예술작품의 역사적 위상이 기술복제가 가능한 시대에 와서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를 가능케 한 사회적 조건은 무엇이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었다. 벤야민은 해당 에세이에서 특유의 변증법적 사유를 총동원하여 예술의 지각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파시즘의 위기 속에서 예술이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기까지 한다. 각 장마다 번뜩이는 통찰력에 머리가 어찔할 정도다.
강의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디지털이미지화 등 오늘날의 예술작품이 처한 조건과 벤야민의 논증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계속된다. 1930년대 프랑크푸르트의 한 비평가가 그려낸 성좌는 2020년의 겨울 하늘에서도 뜨겁게 반짝이고 있다. 찬바람이 도는 바깥 공기와 달리 푸른 불꽃의 방에서의 토론은 열기를 띠어간다.
Outro.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낙엽이 물드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전문영역의 깊이를 더하는 동시에 문화지형의 보편적인 독해를 추구하는 일에는 언제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교양학부는 예술역사와 예술철학자들을 이론적으로 톺아보는 시리즈 이외에도 예술가의 자기 브랜딩, 과학과 예술의 교차점, 동시대 예술의 역할 등을 주제로 초청강의를 기획하며 교내 안팎에서 사유의 발돋움을 촉진해왔다. 계절마다 돌아오는 이 시도가 창작자들 저마다의 마음의 방에 꺼지지 않을 불꽃을 지필 것을 믿는다.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