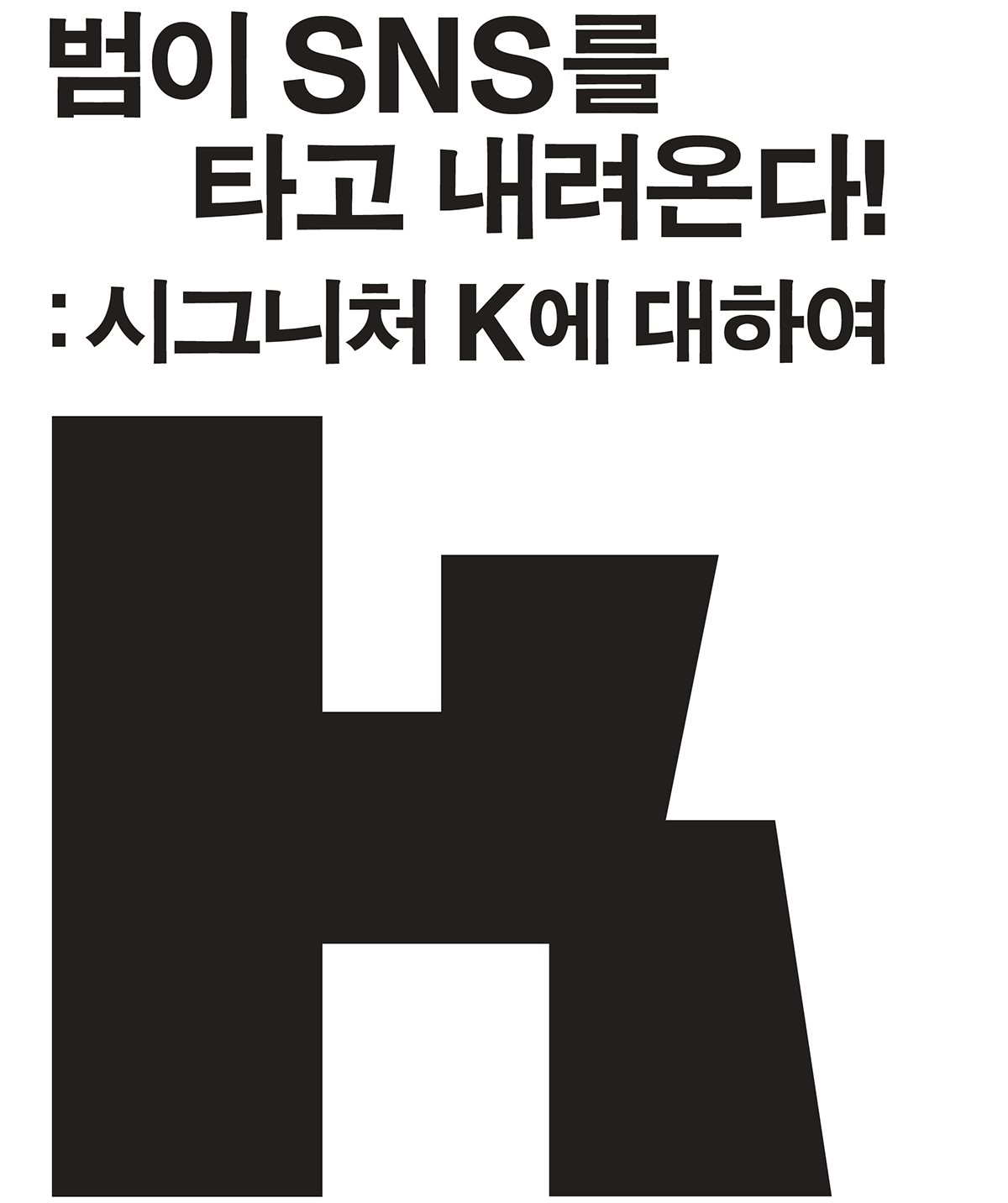
바다에서 열심히 올라온 자라가 토 선생을 호 선생으로 잘못 말한 것을 범이 듣고 신나서 내려오는 판소리, 수궁가의 대목이다. 2020년 ‹범 내려온다›에는 네 명의 소리꾼, 두 명의 베이스, 한 명의 드럼이 있다. 화성 악기 없이 리듬 악기로만 밴드를 구성하여 판소리를 바탕으로 팝 스타일을 혼합한 이날치 밴드이다. 이날치의 장르는 팝, 국악 크로스오버, 얼터너티브 팝, 모던 록 등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이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와 함께 참여한 한국관광공사 ‹Feel the rhythm of Korea› 홍보영상은 유튜브에서 3억 뷰를 돌파했다. 패러디, 리액션 동영상 등 해외의 뜨거운 반응에 “K-흥”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 지난 10월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조선의 DNA, 내 안의 K-흥› 특집을 방송하기도 하였다. 이때 함께 나온 이자람, 악단광칠, 상자루, 두번째달 × 김준수 역시 K-흥을 이끄는 대표 주자들이다.
K-흥 특집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흥이면 흥이지, K-흥은 뭘까. 유행처럼 붙여지는 K-문화들은 왜 K를 붙일 수 있었던가, 우리는 시그니처 K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나.” 이날치를 대중적으로 알렸던 ‹Feel the rhythm of Korea› 시리즈에서 시그니처 K가 가능한 조건들을 보자. 먼저 한국의 홍보 영상을 글로벌하게 매개·유통하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다. 전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시청이 가능한 유튜브 플랫폼은 영상을 글로벌하게 만든다. 이때 세계화된 문화의 장에서 문화와 산업의 조우로 K라는 시그니처가 붙여진다. 그러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성장만이 K-문화를 부상시켰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 K-pop, K-흥, K-cinema, K-drama 등 시그니처 K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르적 혼종성과 시각성을 키워드로 시그니처 K를 살펴보자.
#장르적 혼종성
아디다스 체육복과 갓을 쓰고 ‹범 내려온다›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은 그야말로 혼종이 아닐 수 없다. 이날치의 프로듀서 장영규는 국악이 전통문화의 역사나 당위에 눌려 음악을 즐기지 못한 것은 아닐까 질문하며, 즐기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뭘 해도 그 자체로 아름답고 재미있는 음악을 추구했다.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K-흥을 이끄는 뮤지션들 역시 익숙한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혼합하여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창작 판소리, 영화 음악, 밴드, 뮤지컬 등에서 다양한 얼굴로 등장하는 이자람, K-샤머닉 펑크 그룹이라고 불리는 악단광칠, 농악과 스윙을 합친 상자루, 소리꾼 김준수와 퓨전 에스닉 밴드 두 번째 달의 콜라보는 각자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장르를 시도한다. 전통예술인 굿이 미디어 기술과 연결되기도 한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가든 서울’의 대표작 ‹비손(Two Hands)›은 씻김굿, 별신굿의 전통 구음과 현대적인 일렉트릭 철현금, 일렉트릭 콘트라베이스가 만나 이루는 앙상블을 미디어아트 퍼포먼스로 담았다.
K-drama와 K-pop은 어떨까. ‹킹덤›은 시즌2가 공개된 후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K-좀비물이다. 조선시대에 좀비가 나타났다는 설정으로 미국 대중문화에서 공포의 상징물이었던 좀비물이 사극드라마와 조우하였다. “예측 불가능한 장르적인 쾌감”이 ‹킹덤›의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K-pop의 아이콘 BTS의 ‹피 땀 눈물›도 레게를 기반으로 한 뭄바톤 트랩과 EDM을 적극 사용하여 독창적인 융합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는 차이를 바탕으로 문화들이 서로 경합하며 끊임없이 계속되는 과정인 혼종적인 특징을 가진다. 유운성 평론가는 영화 ‹기생충›(2019)에 대해 “‹하녀›(1960)의 계단을 뜯어낸 자리를 ‹사이코›(1960)를 비롯한 여러 참조물의 계단‘들’로 대체한 자리에서 펼쳐지는 부조리한 희비극”1이라고 평한 바 있다. 한국영화의 형식을 정립하는 것의 어려움에서 K-movie의 봉준호는 그 비형식의 균열을 여러 외국영화로 꼼꼼히 보수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장르적 혼종성이 한국 대중문화 양식의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시각성
K-pop은 뮤직비디오와 무대에서 매력적인 외모,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각적인 음악’이다.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나 공연을 감상하는 리액션 영상이 재생산되는 이유도 시각적으로 볼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이날치 ×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리듬을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풀어냈다고 인터뷰한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단장 김보람의 말대로 이들은 이날치의 음악을 강렬하게 ‘보여준다.’ 온스테이지2.0에서 이날치와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무대를 보여주는 카메라는 멈춰있지 않으며 조명과 의상은 그 자체로 화려하고 강렬하다. 음악의 강렬함을 스펙타클한 이미지로 드러내면서 탈언어적이고 직관적인 특성들이 부각된다. 이를 계속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뉴미디어(유튜브, 틱톡, 넷플릭스, 웨이브 등)에 업로드 되는 시각 이미지가 시그니처 K를 가능케 한다.
K-문화는 시그니처 K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것에 진지하게 임하려는 태도를 자꾸 빗겨나간다. 세계화가 손쉽게 성공하면서 서구의 환상이나 욕망에 맞추고자 하는 포장지가 아니냐는 비판 역시 존재한다. 그러한 비판과 동시에 동시대의 문화를 향유하는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형식의 구축 없이, 오히려 기존 형식화에서 계속해서 미끄러지면서 작품을 생산하고 있다. 새로운 형식에서 발생하는 그 미끄러짐의 감각이 오히려 K-문화의 특징 자체이다. 글로벌화된 문화 산업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과의 마주침이 무차별적으로 다가옴과 동시에 계속해서 새로운 문화를 재생산한다. 토 선생을 호 선생으로 잘못 듣고 신나서 내려오는 범처럼 우리는 K-문화의 장에서 뜻하지 않은 새로운 형식들을 만나고 있다.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