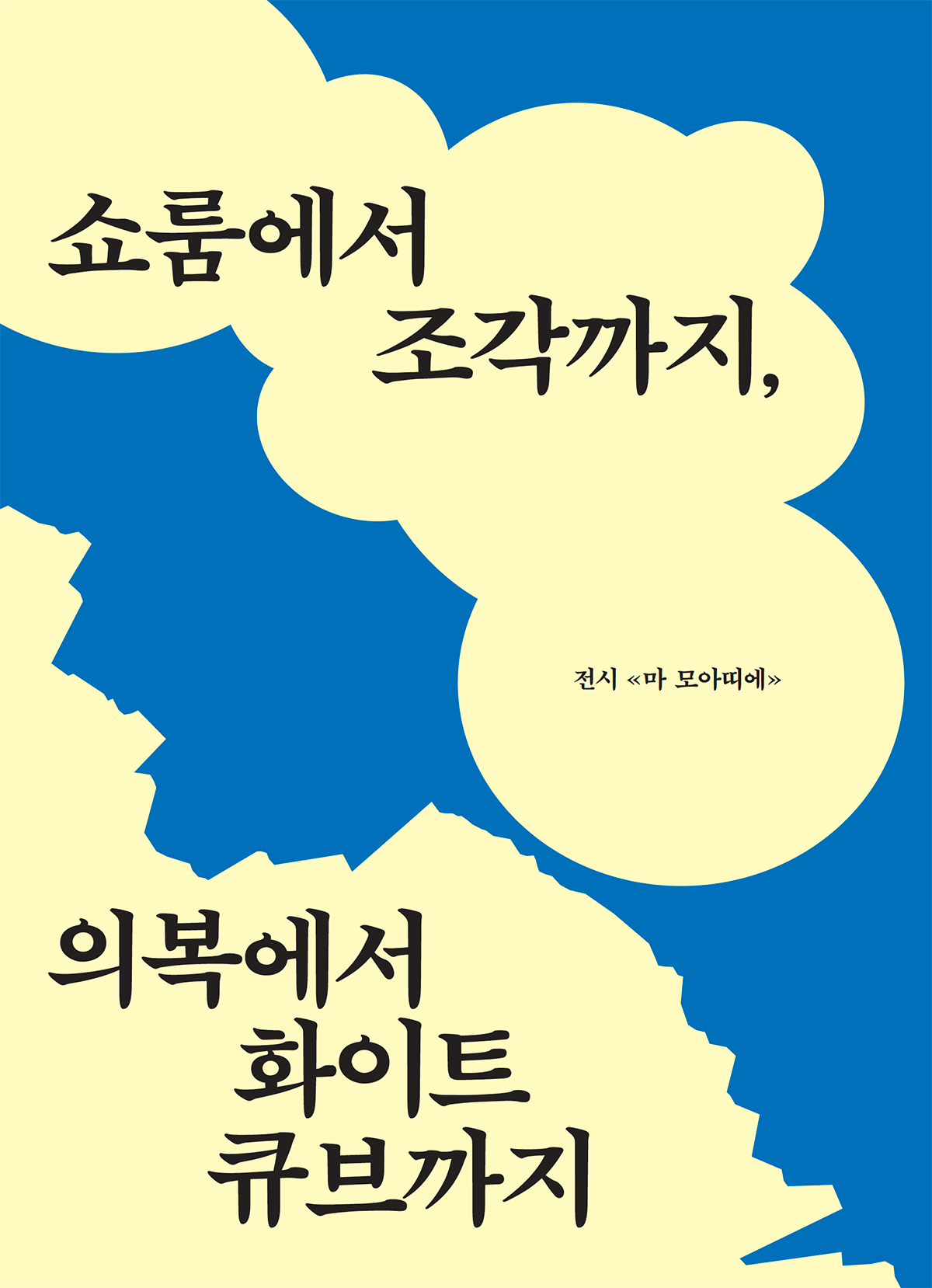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흰 벽면을 따라 어딘가 음울하면서도 감각적인 음악이 흘러나온다. 붓질이 살아있는 파스텔톤의 회화를 지나 쇼룸(showroom)에 들어서자 반짝거리는 것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진열된 이들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며 누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갖고 싶은지 고민해본다. 팸플릿에 적힌 이들의 이름도 확인하고, 세세하게 기술된 재료도 살핀다. 심장, 소장, 간, 남성기, 난소, 반고리관. 쇼룸의 좌대 위에 진열된 ‘장기’만 서른여덟 점이다. 그 외에도 바닥에 놓이거나 천장에 매달아 늘어뜨려진 다섯 점의 ‘복부’는 우아하고도 화려한 쇼룸의 분위기를 더한다. 아크릴과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려진 다섯 점의 ‘무드 테라피 회화’를 배경으로 삼아 자신을 드러내는 패브릭, 스티로폼, 코튼, 페이크 레더 따위로 만들어진 장기는 디자이너 우한나의 새로운 컬렉션 ‹마 모아띠에(Ma Moitié)›다.
1.
이들 ‘착용 가능한(wearable) 오브제’는 총 쉰세 점에 이르며 ‹마 모아띠에›를 구성한다. 작업은 한쪽 신장이 수축한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던 작가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전시 부제이기도 한 ‘마 모아띠에’라는 단어는 한 몸으로 존재했던 남녀의 분리와 상실감을 다룬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탈부착이 가능한 이들 오브제의 특성은 관객과의 공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신체로부터의 소외 경험에 대한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전히 닿지 못할 저편의 자신이라는 상황이 낳는 자기 소외의 상실감에서 출발한 오브제를 제작하는 것은 자위의 차원을 넘어선다. 세 번째 개인전 «물라쥬 멜랑콜리크(Moulage Mélancolique)»(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2019.10.16.~11.15.)와 «슈퍼 히어로(Super Hero»(인사미술공간, 2020.06.19.~08.22.)가 보여주듯 우한나는 패브릭을 소재로 한 조각과 설치를 주로 진행했다. 작업은 대개 장소성을 고려하고, 사건을 발생시키는 시나리오로서 전시의 형태를 띤다. 일종의 연출된 무대로서, 전시 위의 주인공은 작가 자신이거나 가상의 인물이며, 일련의 장치를 통해 관객의 참여도 유도되었다. 또한 작가는 제작되는 시점과 맥락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개입한다.
송은아트큐브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 «마 모아띠에» 또한 전작과 유사한 작업 구조와 작가적 견지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바탕 위에 전시장이 위치한 강남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쇼룸(showroom)과 작업실(studio)로 꾸민 전시장이 중첩된다. 디자이너로서의 우한나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작동하는) 화이트 큐브로 대변되는 전시장과 이를 전면화한 상업적인 공간인 쇼룸을 이으면서 새로운 구조를 생산한다. 여기서 웨어러블한 장기-오브제는 예술과 상품, 무용함과 유용함, 기저와 표면 사이에 위치한다.

모든 작품이미지의 저작권은 (재)송은문화재단과 작가에게 있습니다.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2.
할 포스터(Hal Foster, 1955-)는 『Bad New Days: Art, Criticism, Emergency』(2015)에서 신자유주의 조건 아래 미술과 비평의 역할을 검토하며 동시대 아방가르드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그는 기업과 매스 미디어 등이 세계를 추동하는 현시점을 고려했을 때 급진적인 혁신을 목적으로 한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전략은 그 유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대신 포스터는 주어진 질서에 내재하는 균열의 흔적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강조한다. 포스터의 관점은 저서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좋았던 과거의 것들이 아니라 나쁜 오늘의 것들에서 시작해야 한다”(Don’t start with the good old days, but the bad new ones.)라는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1898-1956)의 문장에 기초한다.
우한나의 «마 모아띠에»는 포스터가 동시대 아방가르드의 가능성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작가들의 실천 양상을 일정 부분 공유하는 듯하다. 포스터의 논의는 질료를 지닌 조각이 갖는 전통적인 모방의 측면을 새로운 국면으로 확장한다.1그는 마임(mime)과 같은, 후고 발(Hugo Ball, 1886-1927)을 위시한 취리히 다다의 비논리적인 기호로서의 언어라는 아방가르드 전략을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의 레디메이드와 구분한다. 그는 전자를 가시적 세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의 모방이자 주어진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이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전략을 동시대 아방가르드의 참조점으로 삼는다.
우한나의 장기-오브제는 화이트큐브와 쇼룸이 중첩되는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 오브제는 조각과 상품의 지위 모두를 갖는다. 이들은 누군가에 의해 간택되어 쓸모 있어지기를 갈구하는 만큼이나 화이트 큐브라는 조건 속의 조각이 되려 한다. 그러나 장기-오브제는 이미 언제든지 판매될 수 있는 조각이다.
이러한 복잡한 맥락을 생성하는 장기-오브제의 중층적 구조는 전시장/쇼룸이라는 공간의 구조와 맞물려 작동한다. 이들 구조는 질료적, 내용적 측면 모두에서 신자유주의적 조건을 모방하며 새로운 의미 생성을 돕는 기호를 낳는다. 그리고 이미 세계 속에 주어진 기표-기의가 아닌, 그 사이를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내러티브를 발생시킨다. 관객의 개입에 따라 여러 지위 사이를 오가는, 애초부터 진열대로서 좌대 위에 놓일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오브제가 그리는 내러티브는 저항적이거나 더 나은 미래를 그리는 순진한 낙관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 장기-오브제 조각은 상품의 옷을 입고 쓸모를 열망한다. 그러나 쇼룸과 전시장은 서로에게 완전히 가 닿는 것에 실패한다. 전시 서문의 서두에서 언급하듯 “명품(brand-name product)이 명품(masterpiece)의 자리를 차지한 시대”의 맥락과 조건을 모방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우한나의 작업은 실용적 조각 혹은 쓸모없는 상품의 스펙트럼 사이를 이동하며 존재하고, 온전히 관람의 대상이 되거나 사용가치만을 갖도록 허락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다중의 내러티브를 생성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자이너 우한나의 작업은 신자유주의 조건 아래 “일관된 형식을 부여하고 동시대의 위태로운 조건을 유형의 것으로 만들어 다른 미래를 가리키는”2 것일지도 모르겠다. 예술적 가치와 시장 가치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점에 우한나의 «마 모아띠에(Ma Moitié)»가 발견한 균열의 지점과 그것이 겨냥하는 것은 무엇일까?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